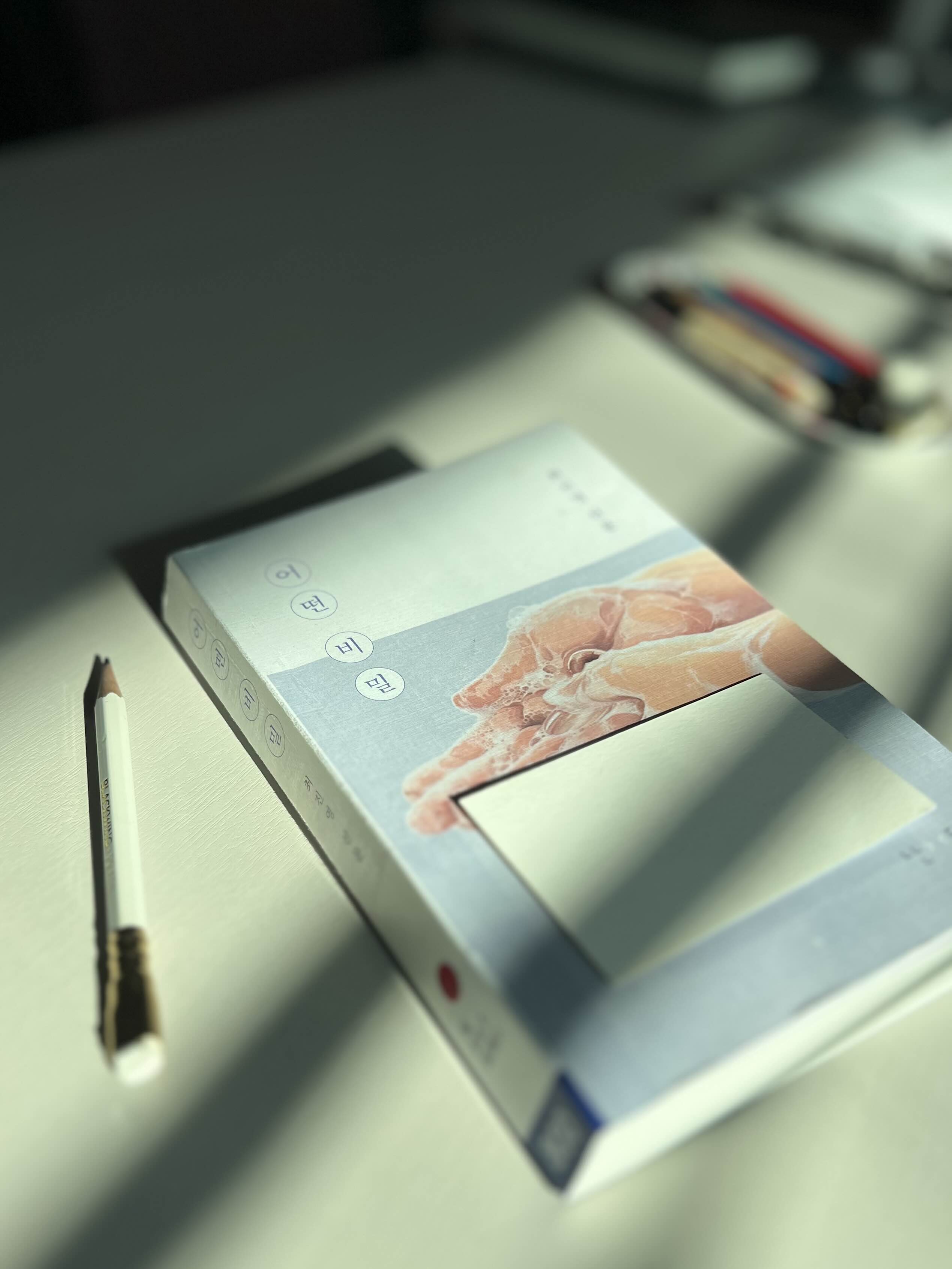117.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반을 살았다고 말해도 될까요. 종이를 반으로 접듯 인생을 반듯하게 접어봅니다. 스무 살의 나와 마흔 살의 내가 만납니다. 반으로 접은 인생을 다시 반으로 접어봅니다. 열 살의 나와 서른 살의 나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렇게 계속 접다보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한 점에서 만나겠지요. 죽음이란 어쩜 그런 것일까요.
126.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에 적당한 인물과 사건을 상상하고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었다. 고치고 다듬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문장을 오래 바라보고 다듬을수록, 이전에는 나에게 상처만 남겼던 거친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에 다가가는 것 같았다. 듣고 싶은 말, 할 수 없는 말, 누구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꺼내보기 두려워 묻어두었던 감정이 문장으로 나타나 나를 바라봤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문장을 소설에 담기 시작했다. 소설을 쓰는 시간은 온전히 나로 존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열일곱 살부터 밤마다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썼던 이유를 뒤늦게 깨달았다. 살고 싶었던 것이다.
258.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여태 남아 있는 기억은 대개 무서움, 불안, 모멸감, 수치심처럼 어른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비밀과 관련 있고 그런 경험은 오직 소설에만 쓸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 척 가공하고 덜어내고 훼손해서, 사실을 지우고 지워서, 격정의 귀퉁이만 겨우 쓸 수 있다. 소설을 쓰면서 잊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당신의 오래된 비밀 떄문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예의를 갖춘다.
___
319. 아주 깊은 곳에 파묻혀 있던 기억을 운 좋게 찾아냈으니, 그 기억을 깨끗이 씻고 말끔히 말려서 소중하게 오래오래 간직해야지.
*
소설가 최진영 작가의 산문집이다.
작가는 절기를 맞으며 스물 네 편의 편지를 썼고, 각 편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해 이 책에 담았다.
이야기 중에는 오래전 일들이 있는데
읽으며 내내 (대부분의 작가들이 물론 그렇지만)
어쩜 이리도 기억을 잘 해낼까, 감탄한다.
아주 오래된 일,
어떤 일은 너무나 세밀해
수 십년을 떨어져도 그리 멀지 않은 기억처럼 보인다.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는다.
깊은 곳에 파묻힌 나의 어떤 기억이,
비밀을 숨긴 기억이
이 참에 운 좋게 떠오를 것만 같다.
한 겹 한 겹 낱장으로 떨어뜨리며
이전으로, 그보다 좀 더 전으로 넘어간다.
좁은 엘레베이터 안을 가득채운 침대에 실려, 나는 공중에 떠있다. 그 침대를 모는 담당자가 머리쪽 모서리에 서고, 아래쪽 가드와 문 사이의 좁은 공간에 아빠가 서있다. 이렇다할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없이, 그냥 멋적게. 웃는 건가 아니었나 싶은 얼굴로 아빠는 거기에 섰다.
그 장면이 떠올랐다. 파묻혔던 기억이다.
침대에 옮겨 눕던 순간부터 하늘색 담요를 덮은 내 몸은 떨었다. 시선이 떨어지는그 발치에 아빠가 가만히 서 있던 것이, 보호자로 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준 것이, 아무 말 안했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던 것이.
그 때의 나는 고마웠던 것 같다.
아빠와 이렇다할 기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애틋한 장면이 있었구나.
가려지거나 덧칠이 된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말끔하게 말려서 소중하게 두어야겠다.
찰나의 기억이 주는 위로가 작지 않다.
그렇다면 언젠가 기억이 될 지금을 조금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내고 싶다.
슬프고 아픈 기억은 떠올리지 않을테니
힘이 될 기억이 되도록 잘 다듬어 저장하고 싶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는 건
앞으로 가는 걸까, 뒤로 가는 걸까.